[스크린과종이] 인간과 대괴수가 만나는 방법 – 고질라 시리즈에 대하여 (40호)
인간과 대괴수가 만나는 방법
– 고질라 시리즈에 대하여
강신유
헐리우드를 통해 다시 한번 고질라가 돌아왔다. 많은 수의 일반관객들에게 고질라는 98년도 헐리우드 버전으로 알려지거나 혹은 킹콩처럼 영화라는 유래를 떠나서도 널리 알려진 고유명사 정도로 인식되어온 것 같다. 하지만 고질라는 1954년 처음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후로 무려 30여편의 작품이 시리즈로 이어져올 만큼 뿌리가 깊은 영화다. 이번 신작 <고질라>를 연출한 가레스 에드워즈 감독도 기존 고질라 시리즈를 섭렵하고 연구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제로 이번 영화는 98년도 고질라와 달리 오리지날 시리즈의 설정과 영화적 특징을 많은 부분 계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레스 에드워즈의 <고질라>를 지난 60년간 만들어진 “고질라들”의 연장선상에 놓고 이것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사이사이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고질라뿐 아니라 다른 대괴수 영화들로 이어져 계속해서 생각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필자는 수많은 고질라 영화들이 커다란 괴물과 등장인물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거의 모든 영화의 주요 피사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질라처럼 거대한 괴물과 인간을 함께 프레임에 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이전까지 필자 개인적으로 고질라 영화에는 인간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고질라 대 모스라>,<고질라 대 메카고질라> 등 다수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미 초기 60년대 작품부터 이 시리즈는 괴수끼리의 싸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대중 인기를 끄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고 나 또한 어린 시절 그런 괴수들끼리의 싸움이 주는 스펙터클을 기대하면서 영화관으로 향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영화속에서 자연스럽게 초점은 괴수들에게 맞춰졌고 그만큼 매혹적인 거대괴수들 앞에서 개미처럼 작은 인간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처럼 느껴졌었다. 이런 식으로 각인된 이미지가 최근까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렛 에드워즈의 <고질라>를 보면서 처음에는 정통 대괴수와 헐리우드 미군 영웅의 조화롭지 못한 접합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글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영화들을 하나하나 다시 본 후에는 이것이 섣부른 판단임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실제로는 인물들의 비중이 무척 컸던 것이다. 그래서 영화들을 다시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인물들이 괴수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로간의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선 고질라 영화에 나오는 대괴수들의 특징을 간단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괴수가 나오는 대표격 중 하나인 킹콩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들이 매우 잘 드러난다. 우선 킹콩은 거대한 유인원 괴물이지만 인간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특히 그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서 앤 대로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은 많은 관객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킹콩이 유인원이라는 설정은 이렇게 여자 등장인물과 킹콩이 서로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띄게 함으로써 인간과의 연결을 한결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질라는 핵과 재앙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초 거대 괴물이다. 특히 대중에게 점점 친숙해지기 이전 초창기로 갈수록 고질라는 무자비하게 인간의 도시를 파괴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질라를 퇴치하고자 한다. 이 때부터 이미 킹콩의 경우와 같은 인간적인 교감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오로지 건물을 부수고 포탄을 난사하는 파괴의 피드백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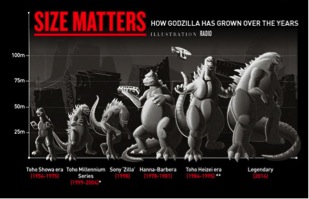
여기에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도시자체를 위협하는 대재앙의 형상화였기 때문일까? 고질라영화의 괴수는 인간에 비해 너무 거대한 나머지 오히려 인간을 실제로 공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괴수들이 송전탑과 빌딩을 파괴하는 이미지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대인 공격을 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이것은 모형 세트와 인형을 가지고 특수촬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가 영화적 형식으로 반영된 것이다. 괴수가 멀리 원경에서 화면의 배경처럼 위치할 때만 인물과 함께 프레임에 담길 수 있다. 실제 크기에 가까운 거대한 모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근경과 원경에 나눠서 합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화적 제약 속에서는 인물과 괴물 사이에는 전투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고질라 시리즈는 인물대신 또 다른 대괴수를 등장시켜서 그들 사이의 싸움을 보여주는 형태로 발전해 나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괴수끼리의 싸움은 아주 흥미로운 오락 요소였음이 분명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은 인물이 안고 가야 했기에 여전히 대괴수와 인물은 직접 대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 거대해지는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 인간은 거대 로봇 “메카고질라”를 만들고 탑승해서 직접 고질라와 살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한다. 이와 달리 크기의 차이를 그대로 지닌 채로 인물과 괴수가 직접 대면을 하는 경우도 있다. 71년작 <고질라 대 해도라>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서는 대괴수가 인간을 직접 공격하는 장면이 여러 번 보인다. 해도라가 주인공 소년을 습격하는 장면에서는 소년의 손에 들린 나이프가 해도라의 몸을 직접 찌르는 것이 크로즈업 화면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인간의 손이 직접 괴수의 신체와 접촉을 하는 장면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지가 주는 충격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후반 장면에서는 들판에 모여 자유롭게 음악축제를 즐기던 히피 젊은이들이 거대한 해도라를 향해 횃불을 던진다. 심지어 이때 해도라는 그 인간들을 직접 공격해서 무참히 죽여버린다.

<고질라>(1954)와 <고질라 대 메카고질라>(1993)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기술적 제약들 사이에서 고민을 통해 꽃핀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CG기술로 무장한 헐리우드에서 대괴수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표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퍼시픽림>에서 거대한 존재들끼리의 싸움이 주는 스펙터클의 표현 실험은 이미 성공했었고, 그 이미지들은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렛 에드워즈의 <고질라>에서는 작은 미군 주인공이 괴수들과 직접 대면을 한다. 하지만 기술에 걸 맞는 참신한 표현은 없었던 것 같아 아쉽다. 하늘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군인들이 괴수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도시를 향해 고공낙하를 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중 개인 비행장비를 가지고 하늘을 날며 용가리와 싸우던 군인이 몸을 날려 용가리의 이마를 가격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고질라>의 고공낙하장면은 어떤 면에서 <용가리> 의 이 장면만 못하다. 그 정도의 표현 기술을 가지고도 괴수와 인물이 직접 접촉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은 오래된 제약이 만들어낸 사고의 틀에 감독이 갇혀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만약 고공낙하한 군인들이 직접 괴수들의 몸 위에 착지했다면 너무나 멋진 장면이 연출됐을 것이다. 앞으로 속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기존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을 넘어서 감각의 지평을 넓히는 장면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고지라 대 해도라(1971)
